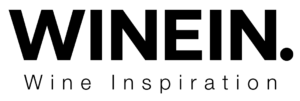메종 J. 드누지에르(Maison J. Denuziere)는 신동와인을 통해 국내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상 브랜드다. 실상 이들의 뿌리는 18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북부 론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보다 눈여겨 볼 것은 드누지에르의 현재다. 드누지에르의 터닝 포인트는 2014년 부르고뉴 출신의 와인메이커 캐롤린 모로(Caroline Moro)의 합류와 궤를 같이 했다. 하이엔드 와인으로 눈을 돌린 와이너리와 와인의 소울을 찾는 와인메이커의 만남은 실로 적절하여, 그녀는 드누지에르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2월 6일, 생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는 캐롤린 모로를 만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드누지에르의 정체성은 확실히 엿보았다.

터닝 포인트와 헤리티지
메종 J. 드누지에르의 역사를 3개의 챕터로 나눈다면 챕터 1은 ‘우마차에 실어 나르던 꽁드리유’로 시작될 것이다. 때는 1876년, 조니 페레(Joanny Paret)는 꽁드리유 와인을 마차에 실어 교회와 로컬 카페로 유통하며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1940년 사위 피에르 드누지에르(Pierre Denuzière)가 물려받으면서 두 번째 챕터는 시작된다. 보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판을 바꾸고 사업을 확장했다. 리옹에서 발랑스까지. 북부 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인을 공급하며 지역에서 가장 큰 와인 유통업자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가업을 물려받길 원치 않았다. 결국 드누지에르는 2003년 부르고뉴 기반의 유명 네고시앙 미셀 피카르(Michel Picard)의 손에 넘겨진다. 드누지에르의 이름을 유지한 것은 1876년 꽁드리유에서 시작한 이들의 역사(와이너리가 꽁드리유 중심지에 있다)를 계승하고, 이 지역 와인 생산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포도 농가들과의 장기 계약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세 번째 챕터는 대변혁의 시기였다. 그간의 비즈니스가 와인 유통쪽에 힘을 실고 있었다면, 피카르가 매입한 후로는 북부 론의 하이엔드 와인 생산자로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2014년 와인메이커 캐롤린 모로가 합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메종 J. 드누지에르는 북부 론의 크뤼라 불리는 꼬뜨 로띠, 꽁드리유, 생 조셉, 크로즈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코르나스, 생 페레 등을 생산한다. 생산량은 적다. 에르미타주는 연간 900병이 고작이고 이 중 60병이 국내에 들어온다. 생 조셉, 꽁드리유, 코르나스도 각각 연 3천 병 정도 출시될 뿐이다.

늘 같은 구획에서 같은 줄의 포도
피카르가 인수하기 전에도 드누지에르 가문은 포도를 매입해 와인을 생산해 왔다. 캐롤린이 말했다. “1972년 드누지에르가 생 조셉에 마르산 포도를 사러 가기 위해 사용했던 티켓이 여전히 남아있다. 20세기 중반에도 드누지에르 가는 코르나스, 꼬뜨 로띠, 에르미타주 와인을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과는 스타일이 다르다. 피카르 가문은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북부 론에 자신들의 밭을 소유하길 원했다. 2007년에는 코르나스의 한 구획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90년대에 포도나무를 식재한 땅이었고 지금은 수령이 35년을 넘는다. 2010년 말에는 꽁드리유 밭을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코르나스의 밭은 엉 싸우만(En Sauman)이란 이름의 1.2ha쯤 되는 구획. 꽁드리유의 밭은 1ha 남짓으로 르 티날(Le Tinal)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북부 론에서 포도밭을 새로 매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밭을 소유한 이들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땅을 웬만해선 팔지 않으려 했다. 농사를 지어 좋은 가격에 포도를 파는 일이 나았다. 한편으론 이 좁고 가파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기에 와인을 만들어 시장에 파는 부담까지는 안고 싶지 않은 작은 농가들도 파다하다. 북부 론의 와이너리들은 보통 특정 농가와 장기 계약을 맺고 포도를 매입한다. “항상 같은 구획의 포도를 살 뿐 아니라, 때론 정확히 특정 줄의 포도를 찜하기도 한다”며 캐롤린은 말을 이었다. “한 번 맺은 파트너쉽을 쉽게 바꾸진 않는다. 서로 투명하게 일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드누지에르 가문 때부터 함께 했던 포도 농가와의 계약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고, 현재 12곳의 포도 농가와 손잡고 있다.

캐롤린 모로의 와인 스타일
캐롤린 모로의 와인 스타일은 ‘누가 부르고뉴 출신 아니랄까’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정작 그녀의 와인메이킹 이력에 부르고뉴는 없었다. 아버지는 부르고뉴에서 금속산업에 종사했다. 물론 생활에 와인은 늘 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과학 쪽이었는데, 포도가 자라 이토록 다양한 모습의 와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농학을 배우기로 했다. 그래서 향한 곳은 보르도. 그곳에서 농학과 와인 양조 학위를 따고는 스페인의 리베라 델 두에로, 스위스 로잔, 프랑스에서는 상세르, 랑그독, 프로방스에서 와인메이킹 커리어를 쌓고 드누지에르로 왔다. 북부 론에서 레드 와인을 만들면서 그녀는 포도를 송이째 발효하는 ‘홀번치 퍼멘테이션(whole bunch fermentation)’을 차용했다. 모든 레드 와인에. 익히 알려져 있듯 홀번치 퍼멘테이션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곳은 부르고뉴, 피노 누아 생산자들에게서다(물론 시라에도 홀번치 퍼멘테이션이 사용되긴 하지만, 피노 누아만큼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녀는 이 방식을 스페인 리베라 델 두에로의 도미노 델 아길라(Dominio del Águila)에서 일할 때 배웠다고 한다. 로마네 꽁띠 출신의 이곳 와인메이커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템프라니요를 포도송이째 발효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홀번치 퍼멘테이션을 배우고 처음으로 포도를 발로 으깨는 작업을 경험했다.

포도송이째 발효를 시키는 이유
그녀가 드누지에르에 와서 처음부터 송이째 발효를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줄기를 쳐내고 발효를 진행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뭔가 결여된 느낌이었다고. “와인에는 소울이 있어야 하는데 괜찮은 와인이지만 감동이 없었다”는 그녀의 말에 예전에 하이엔드 와인에 대해 기사를 쓰던 순간 떠올랐다. ‘하이엔드 와인이란 무엇인가? 맛이 있는 건 당연하고 맛있음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감히 주장했던 지난날이 이렇게 돌아왔다. 하이엔드 와인을 추구하는 와이너리와 와인의 소울을 찾는 와인메이커라니! ‘와인의 소울’이 다소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와인메이킹에 있어서만큼은 구체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했다. 즉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와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와인을 양조할 때 이산화황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와인에서 일어나는 미생물학적인 반응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녀는 앙리 자이에가 생전에 했던 인터뷰의 한 대목을 좋아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제발 안다고 생각하고 와인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1970년대에는 정확한 지식 없이 경험으로 와인을 만드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포도송이째 발효를 하며(오픈 발효조에서 세미 카보닉 마서레이션(semi carbonic maceration) 진행)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만 이용하고 이산화황도 첨가하지 않는다. 5~7일이 지나면 아래에서부터 발효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루에 두 번씩 발로 포도를 으깨주고 피자쥬(Pigeage: 표면에 떠오르는 포도 껍질이나 줄기를 아래로 가라앉혀 추출을 높이는 방법)를 한다. 발효가 끝나면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한다. 오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 주로 부르고뉴에서 18개월간 피노 누아를 숙성했던 오크통을 쓴다. 예외적으로 에르미타주만 100% 오크 배럴 숙성을 거치는데, 일단 에르미타주의 연 생산량이 배럴 3개(900병)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뉴오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에르미타주의 파워는 뉴오크에도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시음한 북부 론의 킹 에르미타주는 말할 것도 없고 코르나스도 아주 좋았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꼬뜨 로띠였다. 다른 와인(2019년 빈티지)들과 달리 꼬뜨 로띠는 2018년 빈티지였다. 해가 많이 나면서도 날씨의 밸런스가 좋았던 해라고. 캐롤린은 무더운 해에 와인을 생산할 때도 홀번치 퍼멘테이션의 이점이 있다고 짚어주었다. 포도 줄기가 알코올을 얼마간 흡수해서 알코올 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알코올이 0.5ABV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다.

북부 론 화이트 와인의 가능성에 베팅
레드 와인도 그렇지만 드누지에르의 화이트 역시 캐릭터가 확연하다. 그녀의 분류법에 따르면 꽁드리유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파워풀하고 크리미한 스타일과 매우 신선한 타입이다. 보통 전자의 스타일이 더 익숙하겠지만, 누가 봐도 그녀의 꽁드리유는 후자였다. 드누지에르의 꽁드리유는 비오니에 특유의 꽃향기와 비누향이 나면서도 바디감이 무겁지 않으며 훨씬 산뜻한 느낌을 준다. 그녀는 꽁드리유를 만들 때 바토나쥬를 위해 오크 배럴을 조금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퀴베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12개월간 숙성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음하진 못했지만 생 조셉의 화이트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을 수 있었다. 생 조셉 지역에서는 레드(시라)와 화이트(보통 마르산, 루산 블렌딩) 와인 모두 생산되고, 드누지에르도 레드와 화이트를 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화이트 와인만 들어온다. 두 선택지에서 화이트가 생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말이다. 신동와인 송승현 과장에 따르면 그만큼 이 화이트 와인이 좋았고, 시장 가능성도 보였다 한다. 드누지에르는 생 조셉에서 오직 마르산 100%로 만든 화이트를 낸다. 왜일까. 캐롤린은 “생 조셉은 매우 긴 지역이라 그 안에서도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크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생 조셉의 북부 와인들은 좀 더 미네랄리티가 느껴진다. 마르산은 꽃향기와 스파이시한 노트가 좋은 푸드 와인인데, 내 생각에 생 조셉 북부의 것이 아주 좋다. 그래서 북부의 마르산만 100% 사용했다. 프랑스에서 고객들에게 치즈랑 화이트 와인을 마시길 좋아한다면 생 조셉 화이트를 선택하라고 추천하곤 한다. 꽁떼 같은 치즈에 마르산보다 더 나은 옵션은 없다.” 이토록 확신에 찬 와인메이커의 조언을 직접 듣고 있으면 조바심이 난다. 어서 꽁떼를 한 조각 잘라 마르산에 곁들여야 할 텐데 말이다. 드누지에르는 와인바나 레스토랑 등 온 프레미스 중심으로 소개될 예정이라는데 그 선택지가 넓어지길 바랄 뿐이다.
수입사 신동와인
▶홈페이지 shindongwine.com
▶인스타그램 @shindongwine
글 강은영 사진 제공 신동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