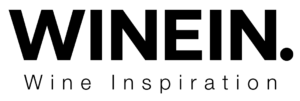로스 바스코스와 까로에는 ‘도멘 바론 드 로칠드 라피트(이하 DBR 라피트)’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DBR 라피트를 구구절절 설명하기란 멋쩍은 일이다.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 샤또 라피트 로칠드를 보유한 그룹’ 이미 이 짧은 소개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DBR 라피트는 보르도 넘어 여러 와인산지를 탐험해 왔다. 로스 바스코스와 까로가 좋은 예다. 전자는 DBR 라피트가 인수한 칠레 와이너리, 후자는 DBR 라피트가 아르헨티나의 거장 까테나 자파타와 합작하여 만든 와이너리다. 최근 방한한 DBR 라피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니저 엘로디 샤보(Elodie Chabot)에게 "왜 DBR 라피트는 탐험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좋은 떼루아를 찾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아무렴 이토록 순수한 목적이 비즈니스 이유의 전부일진 않더라도, DBR 라피트가 좋은 떼루아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DBR 라피트의 새로운 관점
지난 6월 22일 엘로디 샤보의 방한을 기념해 한식 파인다이닝 주은 레스토랑에서 프레스 디너가 있었다. 이 날의 주인공이었던 로스 바스코스와 까로는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디너 행사에서 비교적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던 엘로디가 “한국 젓가락은 일본이나 중국의 것과는 왜 다르게 생겼냐”고 가볍게 질문했을 때, 외부의 시선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두 와인의 탄생에도 그런 새로운 관점과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로스 바스코스는 칠레에서 새로운 품종을 식재하며 실험을 거듭한다. 까로는 여느 멘도자 와인과는 조금 다르게 말벡에 까베르네 소비뇽 블렌딩을 기본값으로 잡으며 빈티지에 따라 품종의 비율을 과감히 바꾼다. 이것은 맛보기.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로스 바스코스의 혁명을 가져온 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칠레에 진출한 글로벌 와인생산자들이 꽤 많지만 DBR 라피트는 그중에서도 빠른 편이었다. 바스크(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에 있는 지역) 출신 가문이 칠레에 이주해 1750년에 설립한 와이너리를 DBR 라피트가 인수한 것이 1988년. 설립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을 로스 바스코스라 붙였다. 로스 바스코스가 자리를 잡은 곳은 칠레에서도 유명산지들이 밀집해 있는 센트럴 밸리 내 콜차구아 밸리다. 태평양의 영향이 미치는 곳. 풍부한 일조량과 이상적 미세기후가 형성되는 이곳은 DBR 라피트가 찾던 ‘좋은 떼루아’였다. 좋은 떼루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최신기술과 오래된 노하우를 겸비한 이들은 어떤 변화를 시도했을까? 와인메이커 필립 롤레(Philippe ROLET, 사전에 현지에 있는 와인메이커에게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는 “관수 방법의 변화가 일대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했다.

DBR 라피트가 칠레에서 포도밭을 매입한 초기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를 이용하며 자연유하관개(gravity irrigation) 방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즉 포도밭보다 높은 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와 댔다. 점적관개(drip irrigation)로 바꾸면서는 필요한 시점과 정확한 지점에 딱 알맞은 만큼 물을 댈 수 있게 됐다. 관개방법이 바뀌자 계곡에만 심었던 포도나무를 언덕에도 식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떼루아였다”고 필립 롤레가 말했다. 토양의 성분과 햇볕의 노출 정도가 다른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자 새로운 포도종도 식재했다. 어떤 종은 월등하게 뛰어났고, 어떤 것은 예상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지만(필립 롤레가 인상적인 결과를 내었다고 말한 새로운 포도 종은 알바리뇨, 쁘디 시라 등이다), 로스 바스코스다운 실험이었다.
르 디스 최고의 빈티지와 로스 바스코스의 미래
1998년은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DBR 라피트가 로스 바스코스를 인수하고 10년이 되던 해, 이들은 칠레 진출 10주년을 기념하여 자신들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최상급 아이콘 와인 르 디스 로스 바스코스(Le Dix Los Vascos)를 출시했다. 르 디스는 불어로 숫자 10을 의미한다. 최상급 퀄리티를 보여주기 충분하지 않은 빈티지에는 생산하지 않는 와인이다. 르 디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빈티지는 언제였냐는 질문에 필립 롤레는 2004년, 2010년, 2018년을 꼽았다.

현재 로스 바스코스는 지역 일대의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다. 총 3600ha의 대지에 포도밭은 690ha. 와인 외에 올리브오일, 꿀, 우유도 생산한다. 말과 양도 키운다. 로스 바스코스 이름 아래 농부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로스 바스코스가 현재 가장 골몰하는 점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이슈’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한국 시장에 로스 바스코스가 소개된 지도 꽤 되었는데, 엘로디 샤보는 “앞으로 더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두 와인 명가가 만나
한편 까테나 자파타와 DBR 라피트 두 와인 명문의 파트너십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9년 시작됐다. 와인생산에 돌입한 건 2000년 빈티지부터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와이너리들의 합작에 의견 차이는 없었을까. 필립 롤레는 “항상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했다. 서면으로 받은 답변은 어쩔 수 없이 건조한 문체였지만, 직접 만난 엘로디가 감정을 듬뿍 담아 확인시켜줬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논쟁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까로가 위대한 와인을 만드는 건 그 때문”이라고. 까로는 까테나(Catena)와 로칠드(Rothschild)의 이니셜을 합한 이름이다. 필립 롤레가 수석 와이메이커를 맡고, DBR 라피트에서 보르도 이 외 지역 테크니컬 디렉터를 담당하는 올리버 트레고(Oliver Tregoat), 필립 롤레가 20년 이상 알고 지내 온 아르헨티나 와인메이커 파블로 세라노(Pablo Serano)가 와인메이킹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까테나 자파타의 수석 와인메이커와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와인 생산을 위해서 1884년 설립된 멘도자의 오래된 와인 셀러도 매입했다. 두 가문의 지분은 50:50. 멘도자 내 산 파블로의 고지대 포도밭을 찾을 때도 함께 했다. 다만 와인 유통에 관련해서 까테나 자파타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

까로의 DNA
아르헨티나 멘도자의 와인들이 말벡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에 비해 까로의 와인엔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보통 말벡과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한다. 아르헨티나 멘도자와 프랑스 보르도를 대표하는 구성인데, 필립 롤레는 “그것이 이번 합작의 뿌리이자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이 블렌딩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한다고. “말벡은 아름답고 관대한 포도종이다. 하지만 오랜 숙성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반면 까베르네 소비뇽은 구조감과 좋은 숙성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품종의 블렌딩이야말로 ‘까로의 DNA’라고 그는 설명했다. 까로 와이너리의 이름을 그대로 딴 시그니처 와인 까로는 빈티지에 따라 블렌딩의 비율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말벡과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렌딩으로 이뤄진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 그 비율이 역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와인 고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필립 롤레는 “우리는 레서피를 따르지 않는다”며 “빈티지에 관계없이 위대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가령 멘도자의 2016년은 흔히 엘리뇨 빈티지로 불리는 이례적인 해였다. 연강수량이 1200 mm에 이르렀다. 평년보다 4~5배 이상의 수치였다. 말벡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포도의 농축미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단다. 반면 까베르네 소비뇽은 말벡에 비해 적응력이 뛰어나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을 높였다. 그 해 기후의 악조건에도 아주 뛰어난 와인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과 함께
디너에서 소개된 와인과 음식 매칭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몇몇 부분만 이야기하면, 먼저 가장 먼저 서브된 로스 바스코스의 소비뇽 블랑. 불쾌지수 높은 장마의 언저리에서 한 줌 햇살 같은 와인이었다. 그래서 벌컥벌컥 들이키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청명하고 바스락한 질감이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다. 한입거리로 준비된 메밀, 전복, 콜라비와는 ‘말해 뭐해’ 잘 어울리는 조합. 더 흥미로운 매칭은 까로의 아루마(Aruma) 말벡과 웅피조개냉채였다. 웅피조개와 갑오징어에 물회 소스 같은 고추장 베이스의 적당한 달콤함이 가미된 소스를 더해 말벡과 매칭하기엔 비릿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깨끗이 씻었다. 주은의 김주용 소믈리에는 “말벡 와인을 무겁게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쥬이시함과 고유의 과일 향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매칭하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스 바스코스의 로제와 깻국만두의 조합도 신선했다. 로스 바스코스의 로제는 상당히 가벼운 스타일로 3~4년 전부터 침용을 줄여서 요즘 더 가벼운 스타일로 출시된다고 한다. 물 대신 마셔도 좋은 낮술 와인의 정석이면서 다양하게 매칭하기도 좋다. 로스 바스코스 르 디스와 금태조림도 꽤 실험적인 매칭이었는데, 섬세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기름진 생선에 시래기가 바디감을 더했고, 소스가 과하지 않아 와인과 충분히 잘 어우러졌다. 와인 자체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까로의 시그니처 와인 까로는 최상급다운 우아함과 세련미가 아주 뛰어났고, 채끝등심구이와는 이상적인 조화를 보였다. 와인의 스토리들은 와인을 마시는 순간을 더 풍요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까로의 아만까야(Amancaya)에 관한 것이다. 아만까야는 안데스 산에서 자라는 희귀한 꽃이다. 이 꽃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설화가 있다 한다. 이 날 이 와인은 인연을 상징하는 붉은 실이 묶인 와인잔에 서브됐다. 두 개의 문화가 만나 이야기에 이야기가 더해졌다.
수입사 인터리커 ▶인스타그램 @interliquor
글·사진 강은영 사진 제공 인터리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