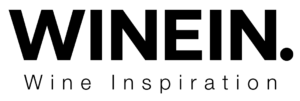가만히 생각해보자. 내가 최근 1달간 산 물건 중에서 세일 가격이 아닌 것으로 산 것이 뭐가 있는지 말이다. 아마도 보자면 매일 가격이 오르는 식당 음식(치킨, 짜장면 등), 흡연을 한다면 담배, 시가대로 판매되는 농산물(감자, 양파 등)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산 물건의 범주에서 본다면 세일 아닌 것이 없다. 1천 원짜리 물건을 판다는 곳을 가봐도 죄다 세일 천국이고, 마트를 가 보아도 물건값에 줄 긋고 아래에 가격을 붉게 써둔 것이 전부다.

저 위의 예를 보고 이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농산물은 시세로 팔고 세일이 없는가”라고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일을 하려면 기준 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상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제도”라는 것이 있다. 고리타분하지만 이 단어의 정의를 기획재정부 사전에서 참조해본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사전에서 이런 말을 명확하게 정의했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깎아준다”라는 키워드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 와인 가격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와인을 10만 원이라고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고 세일에는 80%로 하여 2만 원에 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80%를 세일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수입사는 손해 본 적이 없다. 어쩌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일이 2000년대 당시에 많이 있었고 언론에도 지적받으면서 소비자의 와인 가격 불신에 대한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것이다. 유통자의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의 관점이다. 가령 라면 회사가 2개 있다고 생각하자. 각각 서로 간의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 라면 회사는 100원짜리 라면에 30%의 이익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130원에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100원짜리 라면에 100%의 익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200원으로 한 다음, 30% 세일 하여 140원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130원짜리 라면을 사는 것보다 200원짜리 라면이 30% 세일한다니 그 라면이 더 고급으로 느껴지고 게다가 10원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니 심리적으로 30% 세일된 라면을 선택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사람들이 30% 세일한 회사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 탄로 났을 때이다. 이때 소비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200원으로 판 회사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니, 130원에 판매를 한 회사도 분명히 같은 구조일 것이라고 말이다. 꼭 와인 소비자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심리가 이렇다. 와인 업계 내부나 유통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원가 구조를 잘 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렇던가? 우리가 라면이나 치킨 원가를 모르듯, 소비자는 와인의 가격 구조를 모른다. 내가 시장 보고서에도 내고, 언론에서도 주류의 원가 구조를 올린다 한들 당장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그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싸게 원하는 것을 사느냐에 있다.

그렇기에 카르텔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련된 업계 내에서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협정은 맺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맺었더라도 한 집이 어길 경우 모든 기준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와인 유통 업계에 신사협정은 있을 리 없다. 또한 지금 와인 유통업계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와인은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상품군이다. 도서 시장과 같아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인데, 이 기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지 않다. 도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 공감대가 있으나 와인의 경우에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
칼럼을 쓰는 관점에서 세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선을 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 선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당장 내일 부가세랑 가계 달세,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물건이 빠지지 못하면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한 번 가격이 무너진 와인은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와인은 수입되어도 그 기반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와인 시장은 엄청난 비로 물이 가득 차 있는 댐과 같다. 수도꼭지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데 유입되는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 어떻게든 물을 빼야 하는 입장에서 진퇴양난이다. 그러나 한 번 그 유혹에 빠지고 나면 마약과 같아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세일 물건을 고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우나, 샵 관점에서 세일이 꼭 능사는 아님을 지적하며 글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나도 소비자로써 세일에서 싼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본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글 정휘웅 와인 칼럼니스트

온라인 닉네임 '웅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11,000건에 가까운 자체 작성 시음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김준철와인스쿨에서 마스터 과정과 양조학 과정을 수료하였다. IT 분야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와인 분야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연초에 한국수입와인시장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열 번째 버전을 무료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