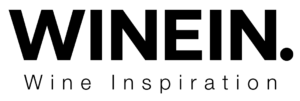<Bio Science> 저널은 2020년 1월자 기사에서 “기후위기는 도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단 이 경고메세지가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가 날씨에 달려있는 와인생산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와인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가지치기 일정을 미루고, 포도를 밤에 수확하고, 쳐내던 잎을 일부 남겨두어 가림막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온상승에 대항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찾다가 무더위에 강한 품종들을 찾아 나섰다. 패키징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속가능성, 유기농, 바이오다이나믹, 내추럴 등 친환경적 생산방식이 강조된 건 물론이다. 마스터 오브 와인 리차드 뱀필드(Richard Bampfield)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와인이란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와인을 판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지속가능성은 생존전략이 됐다. 세계 와인 업계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태양을 피하거나 상대하거나
스페인의 미구엘 토레스는 지난해 한 컨퍼런스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데 있어 기후 위기가 필록세라(전 세계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병충해)보다 더 나쁘다”고 경고했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와인은 대자연의 소관인데, 폭염과 가뭄을 우려하는 한편 우박에 대비해야 하는 극한 날씨들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나파 밸리의 한 생산자는 진판델 포도나무 잎에 진흙을 발랐다. 지난해 여름 37°C를 웃돌던 날이었다. 인간이 선크림을 발라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고령토(kaolin clay)로 만든 스프레이를 나뭇잎에 뿌린 것이다. 생산자들은 태양을 피하는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거나 무더위에 강한 품종들을 찾아 나선다. 호주 맥라렌 베일의 바이오다이나믹 생산자 멜리사 브라운(Melissa Brown)은 <Drinks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더 무더워진 날씨에 맞는 포도종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샤르도네와 세미용은 맥라렌 베일의 80년대 날씨에 최적화된 품종이다. 그래서 찾은 대안은 이탈리아의 화이트 품종인 피아노(Fiano). 멜리사는 샤르도네 포도나무에 피아노를 접목시켰다. 같은 방법으로 알바리뇨도 시험 중이다. 무더위에도 짱짱한 산도를 유지하기로 이름난 베르멘티노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 있다.

보르도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포도
다양한 포도종에 오픈마인드인 신세계 생산국들이 이국의 포도를 영입하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이다. 하지만 프랑스 보르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2019년 여름이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보르도에 새로운 포도종을 심어야 한다는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21년 1월에는 마침내 INAO(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프랑스 와인 원산지 명칭 통제 및 관리기관)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6가지 품종이 보르도에 공식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레드는 또우리가 나시오날(Touriga Nacional), 마르셀란(Marselan), 아리나르노아(Arinarnoa), 까스테(Castets)까지 4종. 화이트 2종은 알바리뉴(Alvarinho)와 릴리오릴라(Liliorila)다. 총 52개의 후보 중 지난 10여 년간 정밀조사 끝에 최종 합격한 품종들이란다. 가뭄에 잘 견디고 질병 저항력도 강하며, 기온이 상승하고 생장 기간은 짧아지는 환경에 잘 적응할 품종들로 고른 것이다. 물론 제약도 두었다. 이 새로운 품종들은 포도밭의 5% 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전체 블렌딩의 10%를 넘을 수 없다. 보르도 와인의 캐릭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한편 파인 와인수집가들은 기후 위기를 우려하여 와인 수집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하는데, 이런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복합적인 이상기후로 최근 와인 수확량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탓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포도종을 유입하는 변수가 생기자 선호했던 기존 스타일의 와인을 확보해두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지속가능하기엔 너무 많은 캘리포니아 포도밭
미국으로 가보자. 실리콘밸리뱅크(Silicon Valley Bank)는 2022년 미국 와인 업계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몇몇 지역은 포도농사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엔 포도밭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다. 공급 과잉이 심해진 것은 2015년경이었다. 이 문제는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코로나19의 침공과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을 덮친 대형 산불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전에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닥치면서 와이너리들의 패닉바잉이 시작된 것이다. 산불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저조하여 일시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평년의 수확량을 회복하면 공급과잉 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위기의 악재도 상황을 더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 가뭄으로 토양은 말라간다. 산불 위험은 커지고 저수량의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한정된 물 자원으로 농사를 짓는 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도나무 몇 ha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와인병이 납작하다면
포도밭과 양조장 그 너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캘리포니아와인협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포도밭이나 양조장보다 패키징과 운송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탄소발자국이 발생한다(포도밭+양조장: 패키징+운송= 49:51 정도의 비율이다). 유리병은 와인을 숙성·보관하기에 적합하지만 무겁고 적재 효율성이 떨어져서 운송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크다. OIV(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에 따르면 매해 300억 병 이상의 와인이 생산되고, 90%의 와인이 구매 직후 소비된다고 업계는 추정한다. 즉, 숙성을 위해 보관하는 와인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매 직후 소비될 와인에 유리병이라는 포맷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와인 패키징이 한층 다양해지긴 했다. 백인박스(bag-in-box)부터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튜브, 종이로 만드는 테트라 팩, 페트병 등등. 유리병보다는 재활용이 쉬운 것들이다. 누군가는 전통 와인병의 형태에 의문을 품었다. ‘소비자들의 집으로 보낸 와인이 배송 미스가 나면?’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질문은 납작한 와인병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갸르송 와인(Garçon Wines)에서 출시한 이 새로운 형태의 와인병은 영국의 흔한 가정집 현관문 레터박스(우편함) 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길고 납작하게 제작됐다. 재질은 가볍고 파손 위험이 적은 페트병. 물론 재활용도 용이하다. 코로나19로 온라인배송과 비대면 방식이 급증하면서 이 레터박스 와인의 수요도 급상승했다. 갸르송 와인의 창립자 산티아고 나바로(Santiago Navarro)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와인생산자들도 유리병에 담은 와인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며 “규모가 있는 와인회사들이 기존의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파커의 녹색마크
2020년 게티이미지가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소비자 81%가 스스로를 ‘환경 친화적’이라고 여기지만 50%만이 친환경 제품만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을 걱정하더라도 실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와인 소비에 적용해보면,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정보 확인도 까다로워 실천을 더 어렵게 한다. 로버트 파커 와인 어드보케이트(Robert Parker Wine Advocate)는 지난해 웹사이트에 검색 조건을 추가했다. 유기농이나 바이오다이나믹 와인만을 분류하여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로버트 파커 녹색마크(Robert Parker Green Emblem)’도 만들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와인생산자들을 가려내어 이 마크로 구별하겠다는 취지. 이 녹색마크를 받으려면 유기농이나 바이오다니믹 인증을 받은 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리차드 뱀필드의 말마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와인이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와인 선택에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글 강은영 사진 제공 Garçon Wines